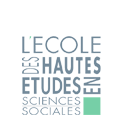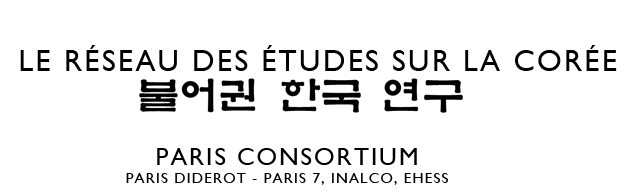|
어찌 어찌 책 한권을 낼 때마다 제법 점잖을(sic) 빼며 얹어야 하는 ‘작가의 말’이 늘 부담스럽다. 적은 분량에 이런저런 감회를 효과적으로 요약하기 힘든 탓이다. 앞에 앉히면 머리말이요 뒤로 돌리면 발문인데, 아무튼 쉽지 않았다.
저자 나름일 것이다. 어차피 간략하게 적는 것이 상례이므로 긴긴 본문을 완성한 여세를 몰아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쓰지 말란 법 없다. 어떤 생각으로 달라붙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썼는가를 밝히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소설류는 좀 다르다. 사회과학이나 경제서적과는 판이한 사람의 이야기인 까닭에, 삶의 어떤 국면을 헤집어 맞장뜨듯 덤빈 의도를 건조하게 압축 개괄하기보다는 독자의 감성에 닿아야 제격이다. 정 안 되면 내용과는 동떨어지게 엉뚱한 화법으로 딴청을 부릴망정 맞바로 드러내야 할 자기 소면素面의 시간이 버겁다. 그만큼 많은 생각이 오락가락, 화룡점정도 아닌 것이 고심참담의 자화자찬도 아닌 것이, 어지간히 붓방아를 찧게 만든다. 문학 평론이라고 안 그럴까. 매일반일 터이다. 대동소이하리라 믿는다.
기어코 해냈다는 성취감에, 어렵사리 일을 저질렀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겹치는 때문일 게다. 쓰기는 맨 나중에 쓰고 싣기는 맨 앞에 싣는, ‘독자 필독’을 노린 머리말일수록 만만찮다. 짧은 문장 긴 여운의 두터운 함의含意를 암시하기 위해 신경을 쓰다가, 기왕지사 구미가 당기게끔 해야겠다는 가외의 욕심이 생기는 것도 이 때다. 하기야 머리말의 모양새도 여러 가지다.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된 것만을 일컫지 않는다. 남의 손을 빈 타서他序마저 흔히 곁들여 자서自序와 구별했다. 일석 이희승 선생께서 동료와 후학들의 책에 써 주신 것만도 수십 편에 이른다.
수정, 증보 판은 물론, 판을 거듭하는 족족 서문을 다시 다는 예 또한 많다. 칼 마르크스의 « 자본론 »(김수행 역)이 가령 유난스럽다. 면무식이나 할 양으로 구입한 5권짜리 책의 중간 제목을 주마간산 격으로 들추다가 보았다. 하품이 나올 정도로 난해한 진술 과정에서 눈에 띈 저자 및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서문이 너무 많았다. 불어판 영어판에도 따로 또 썼거늘, 나 같은 까막눈에겐 그 인문적 서술이 오히려 흥미로웠다.
머리말은 어차피 간략하기 마련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관례도 별무소용인 듯하다. 한참 TV의 공자 강의로 화제를 모은 김용옥의 « 여자란 무엇인가 »의 머리말에 해당하는 ‘앞 잔소리’(前小言 : ‘나는 어떻게 이 글을 쓰게 되었는가.’)는 무려 70쪽에 가깝다. 바로 앞에 놓인 ‘일러두기’까지 합치면 80쪽이 너끈하다. 행갈이조차 거의 무시한 활자의 숲이 압도적으로 빽빽한데, 한 해 먼저 나온 «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에서는 머리말을 또 ‘이끄는 글’로 바꿔, 여전히 길게 써내려 갔다. 소설가 고종석의 국어에 관한 세 권의 탁월한 산문집은 분량과 형식이 각각 특이하여 재미있다. « 감염된 언어 »에서는 ‘서툰 사랑의 고백’ (모국어에 대한) 으로 서문을 대신하더니, ‘서문에 붙이는 군말’을 따로 또 보탰다. « 국어의 풍경 » 때는 여섯 줄 (‘책머리에’)로 요약하는가 하자, « 언문세설 » (‘책앞에’)에서는 딱 2행으로 끝내 버렸다. "모국어는 내 감옥이다. 오래도록 나는 그 감옥 속을 어슬렁거렸다. 행복한 산책이었다. 이 책은 그 산책의 기록이다." …… ‘감옥’ 안에서 행복했노라 시치미를 떼었다.
광복 후에 나온 조선어학회의 « 우리말 큰사전 » 서문은 개인 아닌 단체의 명문으로 꼽힌다. 1972년 « 신동아 » 신년호 부록 « 한국 현대 명논설집 »에도 수록된 역사적 기록으로 뚜렷하다. 이만하면 ‘머리말론’이라는 별도의 논저가 나와도 좋을 성부르다.
그 동안 낸 책들의 머리말만을 모은 김윤식의 파격은 다시 무엇인가. 대하느니 처음인 발상의 묘가 일단 놀랍고 희한하다. 끊임없이 펴낸 책이 그만큼 방대한 증좌려니와, 훗날의 집대성을 미리 염두에 두었던 것처럼 문맥이 그런 대로 잘 맞아떨어져 이럴 수가 싶다. 그랬을 리는 만무인데도 연대순으로 차례차례 나열한 그때그때의 머리말을 읽노라면 문학평론으로 평생을 묶은 이의 외곬 역정이 한눈에 잡힌다. 평론 본래의 생경한 성깔에 가려 있던 글쟁이의 진솔한 자기 노출과 풍경 묘사에 공감하며, 뼈대 위주 글줄에 알맞게 살을 붙이는 넉넉함을 엿본다. 반대로 젊은 시절의 긴장이 연륜을 쌓아가는 데서 터득한 여유로 다소 풀리는가 하자 자신을 얼른 다잡는 기미를 느끼기도 한다. 경어체나 편지 형식으로 문체의 변화를 꾀하며 책의 성격에 따라 양을 적절히 줄이고 늘이는 솜씨에, 그가 남을 추어올릴 때 곧잘 쓰는 ‘고수’의 경지를 떠올린다.
이를테면 보자. 한국 근대 문학, 그 중에서도 비평사 및 소설사 쪽 공부에 뜻을 세우고 첫 번째로 낸 것이 « 한국 근대 문예 비평사 연구 » (1973)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때 쓴 머리말은 상당히 굳어 있다. 대뜸 아라비아 숫자를 앞세워 조목조목 연구 목적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1. 한국 신문학에 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2. 한국 및 그 문학에 대한 터무니없는 애정으로…… 3. 본 연구는…… 4. 비평사라 했을 때 부딪히는 방법론적 문제는…… 식으로 5, 6, 7 까지 내리닫이 토막을 쳤다. 참고 삼아 헤아린 당시 나이 37세. ‘인생의 처음 40년은 본문이고 다음 30년은 ‘주석’이라고 한 쇼펜하우어의 능청에 견줘 그다지 젊지도 않았다. 또한 이 연구서가 평론으로는 썩 드물게 곧 (6개월 후) 재판에 들어간 사정을 감안하면 스타일면에서 웬만큼 멋을 부려도 되련만, 아직 허虛를 버리고 실實을 취할 셈이었던지 군더더기 없이 깍듯하다.
(표정이) 굳었느니, (자세가) 지나치게 깍듯하니 따위 자의적인 표현을 실지로 목격이라도 한 양 구사하는 건 잘못인 줄 안다. 하나 너무 뜻밖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앞뒤 맥락이 똑떨어져야 좋은 이 분야 글발의 성격에 비추어 어쩔 수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 애써 장만한 차림표를 천천히 되돌아보며 후유 ! 어깨의 힘을 빼는 계제 아닌가. 그런들 어떠하리 싶어 우정 해 본 소리인데, 갈 길이 먼 그로서는 자기 수식의 겨를이 미처 없었을 것 같다.
짐작한 대로 그 뒤로는 머리말 운행이 다양해진다. 엇비슷한 형태를 접고 기존의 격식 파괴마저 서슴지 않는 시점 변화를 거듭 시도한다. 때문에 자칫 무미건조하기 쉬운 머리말 모음이 지루하지 않다. 그만한 틈새를 뚫고 다가서는 김윤식의 또 다른 체취라든가 문학적 고민 내지 영역 넓히기 노력을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만든 것이다.
환도 직후였다. 그것은 물들인 군복과 커다란 군화를 끌고, 시커먼 물 흐르는 청계천 뚝길, 거기 늘어선 고서점에서 A. 지드의 « 지상의 양식 » 일역판을 사서 읽던 내 대학 시절의 기억이다. "나타나엘이여, 동정이 아니라 사랑이다. 너에게 열정을 가르쳐 주마. …… 다른 사람이 훌륭히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을 네가 말해서는 안 된다. …… 이 책을 버리고 탈출하라. ……" 지금도 뚜렷이 기억되는 이 병적인 목소리는 내 젊음의 그것이었다. 아마도 나에게 그것은 겨우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혼자있음 (Einsamkeit)이었을 것이다. 그 혼자있음의 방황은 서해 바다 소금 머금은 바람 속에도, 50년대, 60년대, 그리고 지금에도 내 핏속에 맥맥히 흐르고 있는 것 같다. 그 혼자있음의 두려움이 실상 나의 실존적 의미였던 것이다.
« 한국 문학의 논리 »(1974) 머리말의 한 대목이다. 무던히 외로움을 탄 문학병 앓기의 어떤 시기를 뒤늦게 실토한 폭인데, 말미에 보탠 말 역시 절절하다. "혹 사람이 있어 이 책을 읽어 줄 기회가 있다면, 한 사나이의 문자행위로서의 허무의 초월이 얼마나 추상의 경지에 이르렀는가를 발견하게 되리라."고 썼다.
‘혹 사람이 있어……’가 짠하다. ‘한 사나이의 문자행위……’ 가 사뭇 비장하다. 그에게도 이런 곡절이 있었던가. 애초엔 모두 그랬다는 심정으로 더불어 옛 시절을 되새기는 순간, 독자의 마음에도 잠시 우수가 머문다. 또 있다. 비슷한 정황이 « 한국 근대 문학 사상 비판 »(1978)의 머리말에서 재현된다. 이번에는 고향 돌아보기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자기의 근거를 묻는 행위의 일종인지도 모른다. ……나에게 있어 그 근거로서의 생의 충동은 두 가지이다. 먼저 들 것은 쪽빛 바다의 이미지이다. 아, 그 쪽빛, 그리고 그 바다, 그것은 실상 어린 내 혼을 전율케 한 것. 누나의 손에 매달려 몇 시간이나 걸려 항구 도시 M시에 갔었던 날짜나 기타의 디테일이 지금 내 기억 속엔 없다. 다만 차창 너머로 멀리 보이던 그 날의 바다가 쪽빛이었고, 이 너무도 강렬한 빛깔에 나는 거의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따지고 보면 그 쪽빛은 실상 산골에서 자란 나에겐 이른 봄 양지 바른 곳에 피는 제비꽃 그것이었다. 그 눈꼽만한 제비꽃의 쪽빛과, 바다의 그 엄청난 쪽빛의 비교가 어린 혼을 절망케 했던 것이었으리라. 확 트인 수평선만큼 나를 전율케 하는 것은 없다.
기회가 좀처럼 마땅찮아서도 자신이 살아온 삶의 자국을 까발리지 않는 것이 문학 평론가 일반의 속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소설가는 모든 것을 다 소재와 일거리로 삼는다. 현실 세계와 상상의 세계를 마음대로 오가며, 사실도 거짓말처럼 거짓말도 사실인 것처럼, 자기 일도 남의 일처럼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그린다. 아니면 그만이고, 수틀리면 픽션으로 도망가 시치미를 뗀다. 평론가는 어디까지나 그런 대상에 근거를 두고 말을 꾸리기 십상이다. 상상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어 따분하겠구나, 시키지도 않은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진짜 진짜 평론은 거짓말쟁이 소설가 이상으로 세상 속내를 전후좌우 자유롭게 꿰야 하지 않을까. 넓고 반듯한 줏대를 세워 문학 행위의 가닥을 잡아 주다가도 창작인 못지 않은 문학적 체질이 행간에 넘나들어야 한다.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 평필의 웅숭깊음과 변별력이 저절로 갈리고 우러나온다고 믿는다.
익히 알려진 대로 김윤식의 전공은 한국의 근대 문학 연구다. 평론 활동의 본향인 셈이다. 그는 기회 있을 적마다 그걸 일깨우며 강조한다. "저는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제 전공 분야는 우리 근대 문학입니다. …..." (« 한국 문학의 근대성과 이데올로기 비판 »), "제 전공 분야가 우리 근대 문학인 만큼……" (« 김동인 연구 »), "한국 근대 문학은 내 전공 분야이다. ……" (« 김동리와 그의 시대 ») 등등 번거로울 정도로 잦다. 더구나 머리말의 첫머리에.
왜 그렇게 누누이 전공을 앞세우는가를 살피기 전에 무던히도 겸손한 입지立地를 짐작케 한다. "한국 근대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물음 앞에 늘 몸둘 바를 모르는 자리에 나는 서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 속담과 같이, 실상 전공하는 분야가 의외로 자의식에 빠져 혼란을 거듭할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우리 문학의 안과 바깥 »)…… 했는데, 그의 이와 같은 고백에 평론 활동의 초심이 놓여 있다고 본다. 만판 활달하게 ‘타향 ’을 떠돌다가도 때가 되면 일찍 꿈꾸고 뿌리내린 글쓰기의 고향이 그리워 귀환을 반복하는 나그네를 상상케 한다. 일정 기간을 두고 돌아온 고향에서 옛 발심發心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려는 일종의 ‘각성제’ 구실에 다름 아니다. 김윤식의 근대 문학에의 귀의 집착은 따라서 공연한 회고 취미와 무관하다. 현대를 해석하는 데 불가피한 전제로 요긴하게 써먹는 편이다. 어떤 작품의 위상을 세로로 훑어 족보를 매기고, 가로로 뉘여 그전 것과 비교하는 준거로도 삼는 것이다. 일일이 그렇지는 않다. 매번 그렇지는 않되, 김윤식의 평론에는 많은 경우에 그런 분위기가 아슴아슴 배회한다고 느낀다.
다른 각도에서 살핀 그의 근대 문학 연구는 발로 쓴 것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발로 쓴 소설은 흔할망정 ‘발로 쓴 평론’은 생소하거니와, 세 권짜리 « 이광수와 그의 시대 »를 맞춤한 예로 들 만하다. 그걸 만들기 위해 발품이 여간 끈질기지 않다.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조사차 일본에 간 것은 1969년에서 1970년에 걸친 시기였고, 두 번째로 간 것은 1980년이었습니다. 10여년 동안 저는 이광수와 그가 살았던 시대와 장소와 마주하고 있었던 셈이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좌우간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 와세다대학 도서관 서고 속의 냄새, 메이지 학원 구관 앞 은행나무, 기쿠닌교菊人形가 전시된 유시마湯島신사, 도쿄 대학 소나무 숲의 송장까마귀떼들, 붓이 막혀 몇 달을 헤매다가 마침내 이광수의 오른팔인 아베 요시이에阿部充家와 왼팔인 이학수(운허 스님)를 발견했던 일, 자하문 밖 홍지동 산장 춘원의 옛집 근처를 몇 달을 두고 살폈던 일들 - 이러한 것들은 이 책의 그림자일 터입니다. 그것은 제 몫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춘원의 족적을 뒤지고 다녔다. 심지어 메이지 학원 보통부 3년간의 학업 성적까지 찾아낼 정도로 정성을 쏟았다. 3학년 대 석차는 A, B조 60명 중 8등이요, 5학년 때 대수, 삼각은 47점으로 낙제를 면치 못했으나 영어와 관련된 학과는 압도적으로 우수했다는 사실마저 파헤쳤다. 대단히 공력이다.
이광수 연구가 불러온 ‘어떤 운명적 필연성으로’ 착수한 수밖에 없었다는 « 김동인 연구 » 이외의 두 저서, « 염상섭 연구 »와 « 안수길 연구 » 또한 마찬가지다. 도쿄 미타三田에 있는 게이오 대학으로, 일본어와 일본 문학을 누구보다 깊이 배웠다는 염상섭을 찾아나선다. 한중 수교 이전에 출간된 « 안수길 연구 »(1986) 때는 그런 발걸음이 불가능했다. ‘만일 중공과의 국교가 트인다면 간도 문학이라든가 만주국 문학 연구는 새로운 조명과 지평을 열 것’이라는 말로 아쉬움을 달랬다. 길만 막히지 않았더라면 득달같이 날아갔을 것이라는 뜻이겠지…… 격세지감의 감회가 따로 없다.
« 김동리와 그의 시대 »를 포함한 일련의 원조급 대가 연구 시리즈가 대강 그렇듯이, 김윤식은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를 되도록 자상하게 묘사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 김동리와 그의 시대 »에서는 작가의 발자취를 좇아 재생시킨 풍경이 뻐근하게 아름답다.
화계협이라 하지만 화개장터에서 쌍계사 앞까지, 또 세이암에서 칠불암까지가 바로 선경이었다. 약 20리에 걸쳐 뻗어 있는 이 계곡이 그 희고 누르께하고 푸르스름한 돌빛깔하며 양쪽 산기슭의 소나무, 대나무, 대추나무들하며, 가위 별세계였다. 더구나 쌍계사 앞에서 지리산 기슭 가까운 세이암까지 가는 길은 갈수록 더 절경이었다.
기를 쓰고 작가의 뒤를 밟은 결과가 딱딱한 평론을 부드럽게 푸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딴은 그게 다 김윤식의 못 말리도록 부지런한 공부의 노력 덕이다. 지칠 줄 모르는 집필 활동의 바탕이다. 그런 적공을 통해 검증된 근력으로 나라 바깥으로까지 운신의 폭을 넓힌다. 단단한 사전 준비 끝에 예술 기행을 쓰고, « 우리 문학의 안과 바깥 »(1986) 같은 책을 낸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 없이 밑천을 항상 철처히 뽑는다.
차츰 중국을 다룬 글이 눈에 띈다. 최근에 선보인 « 사기史記 속의 공자, 소설 속의 공자 » (« 21세기 문학 », 봄호)도 그 중 하나다. 불과 나흘 동안 산동성 주변 견문을 토대로 쓴 장문이 문학 기행인데, 부제 ‘공자와 더불어 태산에 가다’가 무척 한갓지다. 수시로 인용한 야스시의 « 공자 », « 돈황 », « 누란 », « 풍도 » 등이 나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아 재미있게 읽었다. 그러나 김윤식은 소설 « 공자 »에 이끌려 간 현지에서 « 사기 »의 세계를 보고 얻은 피로감이 깊숙이 젖는다. 육체의 피로만이 아니었을 게다. 이노우에의 장대하고 출중한 로망과 « 사기 »의 연연한 역사성이 주는 문학적 멀미 탓이었으려니 여긴다.
이런 유추의 연장선상에서 그가 오래도록 끼고 산 한국 근대 문학 섭렵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함수관계를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한국의 근대 문학은 불가불 일본어나 일본 문학과 닿아 있고, 이노우에 같은 작가의 중국 경도에 그의 관심이 적잖기 때문이다. 그 전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막 글자를 깨치기 시작하면서 만난 일본에 대한 ‘김 소년’의 아래와 같은 회상이다.
나는 경남 진해군 진영이라는 한 가난한 농민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는 것은 일본 순사의 칼의 위협과 식량 공출에 전전긍긍하던 부모님들 및 동리 사람들의 초조한 얼굴입니다. 국민학교에 입학한 것은 1943년으로, 진주만 공격 2년 후이며 카이로 선언이 발표된 해에 해당합니다. 십리가 넘는 읍내 국민학교에서 « 아까이 도리 고도리 », « 온시노 다바꼬 », « 지지요 아나다와 쯔요갓다 », « 요가렌노 우다 » 등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불렀습니다. 혼자 먼 산을 넘는 통학길을 매일매일 걸으면서 하늘과 소나무와 산새 틈에 뜻도 모르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외로움을 달래었던 것입니다. (« 한일 문학의 관련 양상 - 한 일본인 벗에게 »(1974))
유년의 일제 시대 체험이 그의 근대 문학 탐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는 분명치 않다. 확실하지 않을지언정 음으로 양으로 접근을 쉽게 했을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연구 대상 작가들의 대부분이 일본 문학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더 좀 유리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문제를 근대 문학 연구에 국한시킬 경우, 그들의 문학 성취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짐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런 상황을 딛고 출발한 근대 문학 연구의 실적 위에서 이제는 중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먼저 일본을 찍고 유무상통의 내력으로 불가피한 동양 문화의 삼자대면을 더욱 포괄적으로 가다듬는 단계라고 넘겨짚는다.
아무려나 우리 연배는 ‘그만한 사람이 있어’ 미덥고, 한 시대를 함께 한 증인으로 무섭다. 한낱 단편을 얘기할 때에도 당자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한 옛날 엣적 작품의 호적까지 들이대어 꼼짝 못하게 만든다. 역사적 내림으로 날줄을 삼고 사회성으로 씨줄을 삼는 안목과 박람강기에 어쩔 도리가 없다. 그 어간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헤겔인데, ‘저는 헤겔이 아니고, 헤겔주의자는 더욱 아닙니다.’(« 80년대 우리 소설의 흐름 1,2 »)고 한 발 물러선다. ‘현장 속에 지저분하게 뛰어들어 현장을 묘사할 따름’이라는 게다. 그러나 « 애수의 미, 퇴폐의 미 – 재북 월북 문인 해금 수필 61편 선집 » (1989)에서는 현장에 당도하기 이전에 챙겨야 할 예습의 중요성을 살짝 비친다. "자본주의적인 것을 떠나 근대성을 논의할 수 없다면, 한국 근대 문학사도 자본주의의 본질을 공부하지 않고는 생심도 낼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한국 근대 문예 비평사 연구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제1장으로 삼았음은 순전히 이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인접 학문까지 캐어 원용한다는 반증으로 들린다.
어쨌거나 문학은 통틀어 표현이다. 평론인들 여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명문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아예 가져 본 적이 없다.’(« 문학사와 비평 », 1975)고 그는 일찍이 밝혔다. 다만 문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장이기를 바랄 따름이라고 했다. « 한국 문학의 근대성과 이데올로기 비판 »(1987) 머리말을 ‘해답보다도 잘 묻기 위하여’라는 소제목으로 굳이 부연한 사연도 그 때문이지 싶다. 글쓰기의 기본 자세를 그렇게 시사한 셈이다.
둘 다 힘들기는 매일반이다. 쓰는 이이 개성이나 취향, 또는 장르 따라 다른 솜씨와도 관련되는 일일 수밖에 없다. 독자의 입맛 또한 가지가지여서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 재단할 것이 못 되거늘, 김윤식의 평문評文은 어디 내놔도 당장 표가 날 만큼 유별나다. 무수한 자문자답이 그의 개별화를 돕는 기호로 끊임없이 이어진다.
스스로 ‘……란 무엇인가.’ 묻고 ‘…… 아니겠는가.’로 말꼬리를 올려 반문조로 뒤미처 대답한다. ‘어떠할까.’로 단정을 유보하는가 하면, 언제 적부터인가는 또 ‘소설이란 무엇이뇨’ 투 구식 어법으로 천연스럽다. 김 아무개, 박 아무개 작가의 성명 삼자를 제대로 대지 않고 ‘김씨’, ‘박씨’로 막 부르는 건 또 어떤가. 뿐만 아니다. ‘…… 하기 때문’으로 어미를 사사오입 동강내고, ‘……이지요.’로 까탈스런 평론 문투를 수더분하게 다듬는다. 처음엔 퍽 생소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목에 꺽꺽 걸리듯 야릇했는데 보아 노릇하니 괜찮다. 오히려 구수하게 눈에 익어 친근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그걸 본뜨는 사람까지 더러 생겼으니 그만하면 알아볼 수 있는 것, 특이한 글쓰기의 한 보기로 성공한 것 아니겠는가 ?
남의 글을 숱하게 대하고 천착한 나머지 터를 잡은 산전수전의 한 경지요 결구結句일 테다. 장황한 미문의 홍수에 차라리 진력나 일부러 투박하게 나간 ‘혐의’가 짙다. 텍스트 이상으로 화려한 미사여구에 제물 홀려 핵심을 놓치기도 하는 (일부) 젊은 평론가들의 허를 찌를 셈이었는지 모른다. 김윤식이 아니라도 글자 몇 자 고르자고 몇 시간씩 낑낑거리다 보면 누구나 그만한 유혹에 빠져 묘사의 궁극적인 의미를 되묻기 쉽다. 화장을 지운 소박하고 강건한 문체가 그래서 때때로 그리워진다.
밥 먹고 줄창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에겐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경험칙을 마지막으로 상기하며, 일관되게 가지런한 머리말 모음에 쓸데없는 군소리를 덧대지나 않았는지 저어한다.
|
C’est toujours une corvée d’ajouter en prenant un air digne des « propos de l’auteur » chaque fois qu’on en arrive à publier un livre. C’est qu’il est difficile de résumer différentes émotions de façon efficace en si peu de pages. Placé en tête de l’ouvrage, cela devient un avant-propos et repoussé à la fin, un après-propos, mais quel que soit le cas, c’est un exercice difficile.
Cela dépend probablement des auteurs. Selon l’usage qui veut qu’on fasse court, on pourrait envisager de le faire à chaud, dans la foulée du long texte principal. Il suffirait d’exposer l’idée directrice avec laquelle on s’est attelé à la rédaction du livre et sur quoi on s’est concentré. Mais les choses sont un peu différentes quand il s’agit du genre romanesque. A la différence des ouvrages de sciences sociales ou d’économie, il y est question de l’histoire des gens et il convient moins d’expliquer de façon condensée et sèche pourquoi on a fouillé tel aspect de la vie et pourquoi on s’y est attaqué comme pour le défier, que de se rapprocher de la sensibilité du lecteur. On préfère le cas échéant faire l’innocent en recourant à un discours qui n’a rien à voir avec le sujet du texte, tant pèse lourd ce moment où on doit se révéler à visage découvert et sans fard. Des pensées vont et viennent ; il ne s’agit pas d’apposer une touche finale qui donnerait vie à l’ensemble[1] ni de se torturer l’esprit pour faire son propre éloge, mais en tout cas, on se trouve amené à multiplier les brouillons. Serait-ce différent pour la critique littéraire ? Je suppose que non. Les choses doivent être semblables.
C’est sans doute parce que la satisfaction d’avoir enfin achevé un travail est atténuée par la vague crainte d’avoir commis l’irrémédiable. Le plus difficile c’est l’avant-propos, destiné à « attirer le lecteur », qui s’écrit en dernier, mais qui est placé au début. Alors que l’on se soucie de charger des phrases courtes de connotations denses et d’une résonance durable, naît à ce moment-là un désir supplémentaire, celui tant qu’à faire d’attiser la curiosité. L’avant-propos se présente sous des formes variées. Il n’est pas forcément écrit par l’auteur lui-même. La préface allographe, écrite par une autre personne que l’auteur, est fréquente et se différencie de la préface autographe. Le maître Yi Hisûng alias Ilsôk a ainsi signé plusieurs dizaines de préfaces à des livres écrits par ses collègues et ses disciples.
Il arrive également souvent qu’une nouvelle préface soit ajoutée à une édition corrigée ou augmentée, voire à chacune des nouvelles éditions. L’exemple le plus frappant est celui du Capital de Karl Marx (traduit par Kim Suhaeng). Histoire de remédier à mon ignorance, j’en ai acheté les cinq volumes dont j’ai parcouru les intertitres. J’ai été frappé, dans cet exposé hermétique à faire bâiller, par le nombre important des préfaces signées par l’auteur et Friedrich Engels. Sans parler de celles spécialement destinées aux éditions françaises et anglaises. Le profane que j’étais était plus intéressé par ces écrits à caractère humaniste.
Une préface est concise par nature, mais cet usage ne semble pas avoir de sens pour certaines personnes. Ainsi la préface, nommée « Babil du début » (« Qu’est-ce qui m’a amené à écrire ce texte ? ») de Qu’est-ce que la femme ? de Kim Yongok, rendu célèbre par ses cours télévisés sur Confucius, s’étale sur quelque 70 pages. Avec l’« Avertissement » qui la précède, on en arrive facilement à 80. C’est une véritable forêt de caractères qui ignore le passage à la ligne ; dans Les Etudes orientales, comment procéder ?, publié un an auparavant, la longueur de la préface, appelée cette fois-ci « Texte conducteur », est tout aussi importante. Le romancier Ko Chongsôk a publié trois recueils d’essais sur la langue coréenne dont les préfaces sont originales et intéressantes par leur longueur et par leur forme. Dans La Langue contaminée, il remplace la préface par un texte intitulé « Aveu maladroit d’un amour » (pour sa langue maternelle) et ajoute encore « Paroles inutiles ajoutées à la préface ». Dans Le Paysage de la langue coréenne, il réduit la préface à six lignes (« A la tête du livre ») et dans L’Exégèse de la langue coréenne, à deux lignes (« Avant le livre ») : « Ma langue maternelle est ma prison. Longtemps j’ai erré dans cette prison. C’était une promenade heureuse. Ce livre est composé de notes sur cette promenade »… Il déclare ainsi sur un ton badin qu’il était heureux en « prison ».
La préface du Grand dictionnaire de la langue coréenne que l’Académie de la langue coréenne a publié après la Libération est connue pour sa qualité ; il s’agit d’une préface écrite non par un individu, mais par un groupe. Elle a été incluse dans Le Recueil de discours célèbres de la Corée contemporaine, supplément de Sindonga publié en janvier 1972. Avec des exemples comme ceux-ci, il y a de quoi faire un ouvrage à part du genre « Théories sur la préface ».
A quoi tient la spécificité de l’entreprise de Kim Yunsik consistant à réunir les différentes préfaces qu’il a écrites ? L’idée que je n’avais encore jamais rencontrée ailleurs me paraît singulière, d’une originalité surprenante. On s’émerveille de voir que ces préfaces, qui témoignent de l’ampleur des œuvres qu’il n’a cessé de publier, forment un ensemble si harmonieux qu’elles donnent l’impression d’avoir été écrites dans le but d’être réunies ainsi un jour. Tel n’est sûrement pas le cas, mais quand on lit l’une après l’autre ces préfaces présentées dans l’ordre chronologique, on parvient à saisir d’un seul regard le parcours d’un auteur obstiné qui a consacré sa vie entière à la critique littéraire. Un élan de sympathie naît devant la sincérité de cette exposition de soi et la description du paysage de la part d’un écrivain qui d’ordinaire se cache derrière la rudesse naturelle de la critique ; on discerne une générosité qui lui permet d’ajouter de façon appropriée de la chair à l’ossature qui constitue l’écriture. Quelquefois, au contraire, à peine la tension de la jeunesse a-t-elle semblé laisser la place à une sagesse acquise grâce à l’accumulation des expériences, qu’il se ressaisit. Quand il tente un changement de style en introduisant un vouvoiement ou une forme épistolaire ou qu’il varie la longueur selon la nature du livre, son talent nous fait dire qu’il accède à la qualité d’« orfèvre », mot qu’il emploie souvent pour faire l’éloge d’un autre.
Prenons quelques exemples. Dans Etudes sur l’histoire de la critique littéraire de la Corée moderne (1973), premier livre qu’il ait publié après s’être mis à l’étude de la littérature coréenne moderne et en particulier de l’histoire de la critique et du sosôl, la préface est passablement rigide. D’emblée, il a recours à la numérotation pour détailler ses objectifs :
1. Pour étudier la littérature moderne de la Corée… 2. Avec un amour incommensurable pour la Corée et sa littérature… 3. La présente étude… 4. Le problème méthodologique rencontré lorsqu’il s’agit d’une histoire de la critique… Il poursuit ainsi sans hésitation jusqu’à 6, 7. Par curiosité, j’ai calculé son âge à l’époque : il avait 37 ans. Pas si jeune quand on pense au bluff de Schopenhauer : « Les quarante premières années de l’existence fournissent le texte, et les trente suivantes le commentaire[2]. » Compte tenu du fait que le livre a très rapidement fait l’objet d’une réimpression (six mois après sa sortie) – ce qui est rarissime pour un livre de critique –, son style aurait pu se boursoufler, mais il y reste concis, sans fioritures, comme s’il avait voulu jeter le faux pour ne garder que le vrai.
Je sais que j’aurais tort de recourir à des expressions arbitraires, parlant de rigidité (de l’expression de son visage) ou d’extrême courtoisie (de son attitude) comme si je l’avais vu en train d’écrire. Mais il faut dire que c’est tellement inattendu. Certes il n’y pas beaucoup d’autres possibilités dans un domaine comme le sien qui privilégie une logique limpide, mais une dernière lecture de la table des matières préparée avec soin aurait pu lui permettre de pousser un ouf et de décontracter ses épaules. Je l’énonce comme ça, me disant pourquoi pas, mais j’imagine que lui qui avait encore un long chemin à faire n’avait pas le temps de se parer d’une belle rhétorique.
Comme on peut s’en douter, il a par la suite varié ses préfaces. Renonçant à des formes similaires, il n’hésite plus à détruire les normes établies et tente à plusieurs reprises de changer le point de vue. C’est ce qui permet au présent recueil de préfaces, genre qui pourtant court le risque d’être sec et sans saveur, de ne pas être ennuyeux. Il est conçu de telle façon qu’on peut découvrir tout naturellement des parfums inhabituels chez Kim Yunsik, qui perce des brèches pour exposer un peu plus sa personne, ses questionnements littéraires ou encore ses efforts pour élargir son domaine.
C’était juste après la reconquête de la capitale Séoul. C’est un souvenir de l’époque où j’étais étudiant et où je lisais la traduction japonaise des Nourritures terrestres d’A. Gide que j’avais achetée chez un des bouquinistes alignés sur la digue de la rivière Ch’ônggyech’ôn où coulait une eau noire. « Non point la sympathie, Nathanaël, l’amour. Nathanaël, je t’enseignerai la ferveur… Ce qu’un autre aurait aussi bien fait que toi, ne le fais pas. Ce qu’un autre aurait aussi bien dit que toi, ne le dis pas… Jette ce livre, — et sors… » Cette voix fiévreuse dont le souvenir est encore net était celle de ma jeunesse. C’était sans doute pour moi la solitude (Einsamkeit) au sens vulgaire du terme. Les errances de cette solitude sont dans le vent salé de la mer Jaune et coulent encore dans mes veines, me semble-t-il, tout comme dans les années 1950 et 1960. Dans la crainte de cette solitude se trouvait mon sens existentiel.
C’est un passage tiré de la préface de La Logique de la littérature coréenne (1974). Il avoue ainsi sur le tard qu’à une période de sa vie, il a souffert d’une extrême solitude, de la maladie littéraire, et ce qu’il ajoute à la fin est tout aussi émouvant : « Si une âme daigne lire ce livre, elle découvrira à quel point la transcendance du vide à travers l’acte d’écrire a atteint chez un homme un niveau abstrait. »
« Si une âme daigne… » est émouvant. « L’acte d’écrire chez un homme… » est aussi solennel. Aurait-il lui aussi connu des moments difficiles ? Le lecteur est amené à évoquer son propre passé et à se dire que tout le monde emprunte ce chemin, son cœur sombre un instant dans la mélancolie. Ce n’est pas tout. Une situation similaire se répète dans la préface de La Critique de l’idéologie littéraire moderne de la Corée (1978). Cette fois-ci, l’auteur évoque son pays natal :
Vivre, c’est une sorte d’acte qui consiste à s’interroger sur son propre fondement… En ce qui me concerne, deux pulsions constituent ce fondement. La première, c’est l’image d’une mer indigo. Ah cet indigo ! Et cette mer ! Ils ont fait trembler mon âme d’enfant ! Je ne me souviens plus des détails comme la date à laquelle je suis allé dans cette ville portuaire M, après plusieurs heures d’un trajet durant lequel j’étais resté accroché à la main de ma sœur. Mais la mer qu’on apercevait ce jour-là au loin à travers la vitre était indigo et la couleur était d’une telle force que je ne pouvais pas respirer. Quand j’y pense, je m’aperçois que pour moi qui avais été élevé à la montagne, l’indigo était la couleur des violettes qui s’ouvraient en début de printemps en des endroits ensoleillés. J’imagine que c’était l’indigo de cette immense mer comparé à celui de ces minuscules violettes qui a désespéré mon âme d’enfant. Il n’y a rien qui me fasse trembler plus qu’un horizon dégagé sur la mer.
Il est d’usage qu’un critique littéraire ne dévoile pas les traces de son propre passé, ne serait-ce que parce qu’il n’en a pas l’occasion. En revanche, avec un romancier, tout devient sujet et objet de travail. En faisant librement des allers et retours entre le monde réel et le monde imaginaire, il fait d’une réalité un mensonge et d’un mensonge une réalité, de sa vie celle d’un autre et de la vie d’un autre la sienne. Tant pis s’il se fait prendre, il n’a qu’à se réfugier dans la fiction, si cela lui chante, comme si de rien n’était. Un critique littéraire doit concevoir un discours à partir d’un tel objet. Il doit s’ennuyer dans son travail où l’imagination n’a pas sa place, m’inquiété-je, alors que personne ne me demande mon avis, mais en réalité un vrai vrai critique littéraire ne devrait-il pas pouvoir embrasser librement la face cachée du monde, en avant et en arrière, à droite à gauche, et ce même plus qu’un romancier, c’est-à-dire un menteur ? Même s’il explique un acte littéraire suivant un principe généreux, mais fixe, il doit savoir insérer entre les lignes une qualité littéraire digne d’un artiste. La présence de cette qualité fait apparaître la profondeur et la faculté de discernement dans l’écrit critique.
[1] Hwaryongjômjông, dessiner un dragon avec des yeux qui lui permettent de s’envoler.
[2] « Dans un sens large, on peut dire aussi que les quarante premières années de l’existence fournissent le texte, et les trente suivantes le commentaire, qui seul nous en fait alors bien comprendre le sens vrai et l’enchaînement, la morale à en tirer, et toutes les subtilités » (Arthur Schopenhauer, Aphorismes sur la sagesse dans la vie, traduction de J.-A. Cantacuzène, revue et corrigée par Richard Roos, Paris, Quadrige/PUF, 1943, 2002, p. 168)
Comme il est notoire, la spécialité de Kim Yunsik est l’étude de la littérature coréenne moderne. C’est pourrait-on dire la véritable terre natale de ses activités de critique littéraire. Chaque fois que l’occasion s’en présente, il évoque ce point et le souligne. Les mentions qui suivent apparaissent plus fréquemment que nécessaire et ce dès le début de ses préfaces : « J’enseigne la littérature. Ma spécialité est la littérature coréenne moderne … » (La Critique de la modernité et de l’idéologie de la littérature coréenne) ; « Dans la mesure où ma spécialité est la littérature coréenne moderne … » (Etude de Kim Tongin) ; « La littérature coréenne moderne est le domaine de ma spécialité… » (Kim Tongli et son époque).
Avant même de se demander pourquoi il met tellement en avant sa spécialité, on devine de sa part une position d’extrême modestie. « Qu’est-ce que la littérature coréenne moderne ? Face à cette interrogation, je ne sais où me mettre. Précisément parce que je suis en train d’en faire ma spécialité. Comme le dit un ancien proverbe, on ne voit pas ce qui est sous la lampe ; même si l’on pense que c’est une chose qu’on connaît mieux qu’un autre, il arrive souvent qu’on plonge dans la confusion dans son propre domaine à cause d’une excessive conscience de soi » (Le Dedans et le dehors de la littérature coréenne)…, écrit-il et il me semble que dans ce genre de confession se trouve le principe qu’il a initialement fixé en tant que critique. Cette attitude évoque un voyageur errant librement sur des terres étrangères et qui, l’heure venue, ne manque pas de revenir dans son pays natal, celui de l’écriture, celui où il a ses racines et où il a rêvé. Cette confession n’est autre qu’un « stimulant » à l’aide duquel, rentré dans ce pays natal après une absence, il souhaite donner un nouveau souffle à sa résolution première. L’obsession de Kim Yunsik d’un retour à la littérature moderne diffère du simple goût pour l’évocation du passé. Il en fait un outil, une base indispensable à son interprétation de l’époque contemporaine. Cela lui permet de situer l’œuvre d’un auteur verticalement dans une généalogie et horizontalement en la comparant avec les précédentes œuvres de ce dernier. Cette approche n’est pas systématique, mais même s’il n’en va pas chaque fois ainsi, on sent cette atmosphère imprégner de façon plus ou moins évidente dans beaucoup d’écrits de Kim Yunsik.
Vue sous un autre angle, sa recherche sur la littérature moderne est particulière en ceci qu’il écrit souvent « avec les pieds ». Il existe beaucoup de romans écrits ainsi, mais ce n’est pas le cas des écrits critiques et les trois volumes de Yi Kwangsu et son époque en sont un exemple. Ce texte est le résultat d’une longue et patiente marche.
Pour pouvoir écrire ce livre, je suis allé au Japon de 1969 à 1970 et une deuxième fois en 1980. Pendant dix ans, je me suis confronté à Yi Kwangsu, à son époque et à ses lieux. Je ne sais pas pourquoi, mais toujours est-il qu’il m’était impossible de faire autrement… L’odeur à l’intérieur de la bibliothèque de l’Université Waseda, le ginkgo devant le vieux bâtiment de l’Université Meiji-gakuin, le temple Yushima où étaient exposées les kiku ningyo[1], les volées de corbeaux dans la pinède de l’Université de Tokyo, la rencontre avec Abe Yoshiiye, le bras droit de Yi Kwangsu, et avec Yi Haksu (moine Unhô), le bras gauche de ce dernier alors que j’étais sans inspiration depuis des mois, le fait que j’ai tourné des mois dans les environs de l’ancienne maison de Ch’unwôn, un pavillon situé dans le quartier Hongji de l’autre côté de la porte Chaha - tout ceci constitue l’ombre de ce livre. C’est ma part.
C’est avec autant de zèle qu’il a suivi les traces de Ch’unwôn Yi Kwangsu. Il a même retrouvé les bulletins de notes de ses trois années à l’Université Meiji-gakuin. Il a découvert qu’il était au 8e rang des soixante élèves des groupes A et B de la troisième année et qu’en cinquième année, il avait échoué en algèbre et trigonométrie avec 47, alors qu’il s’était montré nettement supérieur aux autres dans les matières qui concernaient l’anglais. C’est un réel exploit.
En dehors de l’Etude de Kim Tongin, à laquelle ses recherches sur Yi Kwangsu l’ont conduit « par une sorte de nécessité fatale », il en va de même pour deux autres ouvrages, l’Etude de Yôm Sangsôp ou l’Etude de An Sugil. C’est ainsi qu’il est parti pour l’Université de Keio à Mita, à Tokyo, sur les pas de Yôm Sangsôp qui avait approfondi plus que quiconque l’apprentissage du japonais et de la littérature japonaise. Ce genre d’expédition n’était pas possible pour l’Etude de An Sugil publiée en 1986, soit avant l’établissement des relations diplomatiques entre la Corée du Sud et la Chine. Il se console en déclarant : « Si un jour des relations diplomatiques s’ouvrent avec la Chine communiste, ceci apportera de nouveaux éclairages et ouvrira de nouveaux horizons à la recherche sur la littérature de Kando[2] et de la Mandchourie. » Il voulait sans doute dire que si ces horizons n’avaient pas été barrés, il s’y serait envolé sur le champ… N’est-ce pas avec émotion qu’on constate que, depuis, les choses ont changé ?
Comme c’est généralement le cas dans une série d’études sur les grands écrivains telles que Kim Tongli et son époque, Kim Yunsik se donne toujours du mal pour fournir une description aussi précise que possible des lieux où l’écrivain a séjourné. Dans Kim Tongli et son époque, le paysage qu’il ressuscite en retraçant le parcours de l’écrivain est d’une beauté presque douloureuse :
Ce n’est pas pour rien qu’on parle de la vallée du Parterre ; le paysage est divin du marché Hwagyae jusqu’au temple Ssanggye et du rocher de Seiam au rocher de Ch’ilbulam. Dans cette vallée qui s’étend sur une vingtaine de lis, les pierres sont blanches, jaunâtres et verdâtres et les pins, les bambous et les jujubiers forment sur les deux côtés de la pente un véritable monde stellaire. Depuis le temple Ssanggye jusqu’au rocher de Seiam près du pied du mont Chiri, la beauté atteint la perfection.
Le fruit de cette quête obstinée sur les traces de l’écrivain contribue à atténuer la rigidité des écrits critiques. Mais ceux-ci résultent avant tout d’un incorrigible zèle de Kim Yunsik pour le travail, qui constitue le fondement de ses inlassables activités d’écriture. Grâce à ses talents mis en valeur par un labeur constant, il élargit son champ d’activité au-delà des frontières : ces solides recherches préalables lui permettent d’écrire d’artistiques récits de voyage et de publier des livres comme Le Dedans et le dehors de la littérature coréenne. Il ne rentre jamais de ses voyages les mains vides, mais en tire un maximum de bénéfices.
On remarque qu’il traite de plus en plus de la Chine. « Confucius dans la Grande Histoire, Confucius dans les sosôls » (Littérature du 21e siècle, printemps 2001), publié récemment, en est en exemple. C’est un long récit de voyage littéraire qu’il a tiré de ses quatre jours dans la province de Shandong ; le sous-titre en est poétique : « Aller à la montagne Tai Shan en compagnie de Confucius. » Il cite souvent Confucius, Les Chemins du désert, Lou-lan et Vent et vagues d’Inoué Yasushi[3], textes qui me sont familiers, ce qui a augmenté mon plaisir de le lire. Mais après cette découverte du monde de la Grande Histoire dans ces lieux où l’a conduit la lecture du sosôl Confucius, la fatigue s’abat sur Kim Yunsik. Ce n’est sans doute pas une simple fatigue physique, mais un mal de mer littéraire provoqué par l’historicité qui coule sans cesse à la fois dans la Grande Histoire et le long et magnifique roman d’Inoué.
Ne pourrons-nous pas, en prolongeant cette déduction, réfléchir sur les péréquations entre la littérature coréenne avec laquelle il cohabite depuis si longtemps et le Japon ou la Chine ? La littérature coréenne moderne est inévitablement liée à la langue et à la littérature japonaises et Kim Yunsik s’intéresse au voyage en Chine d’un écrivain comme Inoué. Mais il faut auparavant parler d’une chose : de l’évocation comme celle qui vient ci-après par « le jeune Kim » du Japon qu’il rencontre à peine après avoir appris à lire :
Je suis né fils aîné d’un paysan pauvre à Kimhae dans la province du Kyongsang-Sud et aujourd’hui encore je me souviens avec netteté de la menace du sabre des policiers japonais et des visages de mes parents et des villageois qui craignaient les réquisitions de vivres. Je suis entré à l’école primaire en 1943, deux ans après l’attaque de Pearl Harbor et l’année de la déclaration du Caire. A l’école du bourg éloignée de plus de dix lis, j’ai appris à chanter Akkai tori kotori, Onshi-no tabako, Chichi-yo anatawa tsuyokatta, Yokaren-no uta, sans savoir ce que les paroles signifiaient. En franchissant tous les jours à pied la colline qui menait à l’école, je me consolais de ma solitude en fredonnant sous le ciel, les pins et les oiseaux des chansons dont je ne comprenais pas les paroles (Les Aspects des relations entre la littérature coréenne et la littérature japonaise – à un ami japonais, 1974).
Déterminer l’influence que son expérience enfantine de la colonisation japonaise a exercée sur sa recherche de la littérature moderne n’est pas évident. Même s’il n’est pas possible de le prouver, on peut cependant aisément supposer qu’elle lui en a facilité l’approche dans un sens ou un autre. Quand on prend en compte le fait que la plupart des écrivains qu’il a étudiés avaient dû de quelque manière passer par la littérature japonaise, on peut deviner qu’il est parti avec un avantage relatif. Je veux dire par là que quand on considère uniquement la recherche de la littérature moderne, cette expérience a joué en sa faveur ou, du moins, n’a pas été une charge pour lui dans sa compréhension de leur parcours littéraire. N’est-il pas en train de tourner son regard vers la Chine en s’appuyant sur les résultats obtenus en matière de recherche en littérature moderne, en partie à partir de ces prémisses de l’enfance ? Après s’être intéressé au Japon, il est au stade, imaginé-je, où il envisage la comparaison de trois littératures asiatiques, chose inévitable vu les échanges entre les trois pays.
Quoi qu’il en soit, notre génération est fière de compter « une telle personnalité », impressionnant témoin de notre époque. Même quand il parle d’une simple nouvelle, il cerne l’auteur en révélant jusqu’à la filiation de ses œuvres précédentes dont l’intéressé se souvient à peine. On reste désarmé devant l’étendue de ses connaissances et de sa mémoire quand il prend « méridiens et parallèles », d’un côté avec l’historicité et de l’autre la socialité. Hegel apparaît souvent dans ses discours même s’il garde une certaine distance : « Je ne suis pas Hegel, encore moins un hégélien » (Le Courant du sosôl coréen dans les années 1980 1 & 2). Il déclare qu’il « se jette sur le chantier et ne fait que le décrire ». Mais il fait aussi allusion à l’importance d’une étude préalable à l’arrivée sur ledit chantier dans La Beauté de la mélancolie, la beauté de la décadence – anthologie de 61 essais des écrivains résidents en Corée du Nord ou qui y sont passés, dont l’interdiction s’est levée (1989) : « S’il n’est pas possible de discuter de la modernité sans mentionner le capitalisme, ne serait-il pas impensable d’entreprendre l’histoire de la littérature coréenne moderne sans avoir étudié la nature du capitalisme ? C’est la seule raison pour laquelle j’ai consacré à la littérature prolétarienne le premier chapitre de mon étude de l’histoire de la critique littéraire coréenne moderne. » On comprend par là son message, à savoir qu’il faut fouiller et puiser sans répit dans les disciplines voisines.
En tout cas, toute littérature est expression. La critique ne fait pas exception, mais il avoue très tôt qu’il « n’a jamais eu l’ambition d’écrire de belles phrases » (Littérature et critique, 1975). Et ajoute qu’il veut simplement ne pas faire trop d’entorses à la grammaire. Je suppose que ceci explique pourquoi il a donné pour titre à la préface de sa Critique de la modernité et de l’idéologie de la littérature coréenne moderne (1987), « Pour mieux interroger et non répondre ». C’est sa façon d’annoncer comment il se situe au regard de l’écriture.
La critique est tout aussi difficile que la littérature. Elle dépend aussi inévitablement de la personnalité et du goût de celui qui écrit, du talent que nécessite le genre. Il y a autant de goûts que de lecteurs, il est donc difficile de tailler un seul jugement noir sur blanc sur tous ses écrits, mais ceux-ci sont particuliers au point d’être aisément identifiables en toutes circonstances. Ce qui le rend unique, ce sont d’interminables séries de questions et de réponses.
Il se demande : « Qu’est-ce que… », finit par se répondre par une autre question au ton montant : « Ne serait-ce pas… » Il retarde l’affirmation avec « pourquoi pas » et récemment il feint de sacrifier à une rhétorique ancienne du genre « Qu’est-ce le sosôl ? » Que dire de son habitude d’appeler les gens « Kim » ou « Pak » au lieu de les nommer par leur nom entier ? Ce n’est pas tout ! Il mutile la phrase en supprimant la fin : « Parce que… » ou adoucit la rigueur du discours critique par : « Je voudrais vous dire que… » Au début, tout cela me paraissait étranger et ne me plaisait guère. C’était tellement bizarre que cela me restait un peu en travers de la gorge, mais avec le temps je m’y suis habitué. Au contraire je reconnais ses écrits qui ont pour moi une résonance familière. Il a même des imitateurs, ce qui est un signe de reconnaissance, un signe de réussite en tant qu’exemple original dans le domaine de l’écriture.
Ces textes marquent l’aboutissement des péripéties vécues par l’auteur et un terme auquel il est arrivé à force de lire et de comprendre les écrits des autres. On peut le « soupçonner » d’avoir opté pour un style volontairement rustique pour cause de lassitude devant des flots de longues et belles phrases. Il avait peut-être aussi l’intention de prendre au dépourvu (certains) jeunes critiques qui, séduits par une belle rhétorique, ont tendance à laisser filer l’essentiel. N’importe qui peut se faire piéger par une telle tentation, surtout lorsqu’il peine des heures à choisir pour aligner quelques caractères, et se demande finalement quelle est la véritable signification de sa description. Un style simple et dépourvu d’artifices est quelquefois le bienvenu.
En me rappelant la règle provenant de l’expérience et qui veut qu’on ne peut pas rivaliser avec une personne qui s’adonne à une besogne en dehors du temps qu’il consacre à ses besoins vitaux, je crains d’avoir ajouté à cet harmonieux recueil de préfaces des propos inutiles.
[1] Poupées de chrysanthèmes.
[2] Région de Yanji.
[3] Journaliste et écrivain japonais (1907-1991).
|